호랑이 말로 ‘안녕’은 무엇일까? ‘웃후후’란다. 호랑이와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이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말이다. 외국인이 흘리면서 한 말이니 내가 잘못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있다 해도 한 지역 사투리일 테니 권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과학과 역사에 관한 많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얼마 전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학습 수단이 생긴 셈이다. 내셔날 지오그래픽 채널은 2007년 동물 아카데미(Animal like us)라는 시리즈로 된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였다. 인간과 유사한 동물세계를 관찰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들을 보여준다. 여기에 나오는 동물들은 자신들의 사회에 문제가 되는 동물을 집단적으로 징계하기도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합집산하기도 한다. 사회적이라는 말이다. 우리의 관찰력이 부족해서 몰랐을 뿐이지 서로 대화하고, 질투하고, 용서하고 또 화해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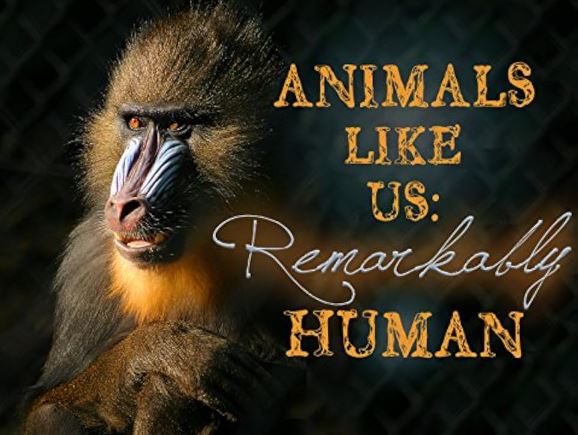
더 이상 인간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정치적 동물’이라고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도구의 사용 방법을 다음 세대에 전수시키는 등, 동물의 도구 사용도 문화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보고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라면 이제껏 우리가 자연을 잘 몰랐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손자병법의 모공(謀攻) 즉 전략편에 나오는 지피지기(知彼知己)에서의 적은 그야말로 싸워야 하는 상대방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상에서의 우리는 누가 우리의 적인지 또 싸워야 하는 상대인지도 알 수 없다. 아니 반드시 싸워야 하는 지도 분명하지 않다. 현대적 해석으로 피(彼) 즉 상대방은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대치하고 있는 적은 물론이고 자연적인 환경과 시대적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불확실성을 포함한다는 이야기다. 결국 지피(知彼)란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기 위해서이지만, 그 밖에도 우리는 자연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실제로 과학기술의 역사가 곧 자연 모방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을 모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 원시 시대에 사용되던 칼과 화살촉 같은 사냥 도구는 육식 동물의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을 모방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인류 역사상 중요한 발명 중 하나인 바퀴는 통나무나 둥근 돌이 굴러가는 것에서 영감을 얻었을 만하다. 아니 생물 중에도 자신의 발과 몸을 움츠려 둥글게 만든 후 굴러서 도망가는 거미도 존재한다. 새를 모방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돌고래 꼬리를 흉내 낸 배의 프로펠러, 새의 신경체계를 흉내 낸 비행기의 자동 항법장치 등 사람은 자연 생명체를 모방해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는 기계의 발명을 계속해왔다. 이러한 자연을 모방으로 발전하는 기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예 생체 모방공학 그리고 더 나아가 자연모사공학(Nature-Inspired Engineering)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자연을 흉내 내자는 학자들의 모임이 생겼을 정도다.
그들은 이제 자연계의 나노 구조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게코 도마뱀은 파리나 모기보다 훨씬 무겁고 더구나 발바닥은 매끈한데도 기막히게 벽을 잘 탄다. 게코 도마뱀 발바닥에는 수십억 개의 200㎚에서 500㎚(나노미터·10억 분의1m) 굵기의 가는 털이 있기 때문이다. 도마뱀의 발에선 어떠한 접착물질도 분비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수십억 개의 미세한 털과 벽면 사이에 전기적으로 끌어당기는 힘(반데르발스 힘, van der Waals’ force)이 작용하여, 도마뱀의 몸무게를 지탱할 만한 강한 접착력을 발휘한다. 이제 과학자들은 접착제가 필요 없는 건식 부착물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도마뱀 발바닥을 들여다보고 있다.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기술뿐이 아니다. 자연에서 겸손을 배우고, 끈기와 공생의 원리를 깨닫는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으로 자연의 원리로부터도 독립적이지 않다.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배우며 또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Edward O. Wilson 교수는 1975년 <사회생물학: 새로운 종합>에서 “사회과학은 가까운 미래에 생물학의 한 분과가 될 것” 이라고 장담했다. 인간의 삶도 다른 생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다. 사실 윌슨의 말은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이 그의 저서 <종의 기원>에서 예언한 “심리학은 새로운 토대 위에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에서 진화된 듯하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서양철학은 살아 있는 자연을 생각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를 자연철학이라 불렀다. 과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불리는 아이작 뉴턴Isaac Newton도 자신을 자연철학자로 생각했다. 뉴턴이 저술한 논문집 제목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The 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물질과 생명체를 구별하고, 다른 생물체와 인간을 분리해 왔다. 인간의 존엄성과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단순히 무지했을 수도 있다. 인간만이 의지로 살아가고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우주의 모든 생물도 생존과 번식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말이다. 반면 요즘 일부 환경론자들은 생태계에서 인간을 제외 시킨다. 인간의 무지함과 욕심을 꾸짖으며, 자연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노력이다. 인간이 생태계에서 가장 해로운 존재일지 모르나, 그렇다고 인간 역시 생태계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은 복잡하지만, 그렇다고 혼돈의 상태는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규칙이나 원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아니 원래는 어떤 완벽한 원리에 의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이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일찍부터 그런 원리를 찾아 헤맸다. 노자는 일찍부터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만들고 가치를 가지게 하는 절대적이고 참된 자연의 원리를 도(道)라고 정의하였다. 문제는 노자의 도는 인간의 감각적 경험으로는 도저히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노자의 도(道)는 ‘보고자 해도 볼 수 없고, 듣고자 해도 들을 수가 없고, 붙잡고자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노자의 도(道)’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자연원리를 필요로 한다.
많은 대가들에 의해 이제 그 일부는 우리에게 모습을 내밀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자연을 이해하고 또 세상의 원리를 깨달아 왔을까? 사실 우리들은 학창시절 자연에 대한 지식을 익히면서 알게 모르게 그 방법도 함께 배워왔다. 그 방법론이라는 것을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분석하고 상상하고 통합하는 능력이다. 분석이란 기본적으로 사물을 잘라서 관찰하는 것이다. 집중하여 바라볼 때 그 원리를 더 쉽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연과학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Analysis)이란 하나의 전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과 요소들로 ‘하나하나’ 풀어내는 일이다. 예를들어 바닷물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닷물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바닷물을 잘게 짜르는 것 자체가 과학이기는 하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 큰 바다의 염분의 농도는 약 3.5%정도로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소금을 나트륨(Na)과 염소(Cl)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잘라진 조각들간의 관계와 더 나아가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예를들어 바닷물의 짠맛은 염화나트륨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였다면 인과관계를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 염화나트륨이 다름아닌 소금이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보다 인과관계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외의 상관관계는 조각들간의 같음과 다름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는 그 일부를 알아낸다. 그런 것이 분석이다. 분석이란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과도 관계가 있다. 지기(知己)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많은 요소를 한번에 생각하는 데 미숙하다. 대부분의 현실문제가 복잡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번에 생각하면 혼란스럽다. 반면 복잡한 현상을 몇 개의 요소들로 나누어 이해하면 전체를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물과 다양한 현상들은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비밀코드’를 은밀히 내밀기 시작한다.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말이다.
잘게 나누어 생각하는 분석 과정에서 원 실체의 일부를 잃어 버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사물의 실체나 자연의 현상은 단순히 요소의 합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의해 만들어 지기 때문이다. 요소간에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단순한 ‘합’이 아니라 ‘곱’하기의 함수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곱하기’인지를 상상해 봐야 한다. 하나의 특징을 알아채고 전체를 그려본다든지, 보이지 않는 관계를 추정해 본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그런 것이다. 분석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현실을 많이 왜곡시켜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상상력을 통해 단순화된 모형에서 현실로 가는 ‘상상의 도로’를 만들어 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의 현실은 또 한번 비틀어 진 모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 우리의 이해도는 높아간다. 이제 부분을 묶어서 새로운 전체를 창출해 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합(Synthesis)이라 할 수 있다. 통합이란 분석을 통해 얻어진 부분부분의 중요한 사실을 함께 짜 맞추는 작업이다. 그런 과정에서 얻어진 원리와 법칙으로 전체를 이해하고 또 설명하게 된다. 그런 의미의 통합에서 우리는 통찰력을 얻어낸다.
한 동안 자연과학뿐 아니라 사회과학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과에 도취되어, 각자 스스로의 길을 가기에 너무 바빴다. 결과적으로 지식은 점점 더 빠르게 파편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한 부분에 대해 깊이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는다. 다시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일부는 스스로 이를 실행한다. 학문의 연구나 일상에서의 생각하는 방법 모두 마찬가지다.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석과 통합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르는 것을 만나면 분리해서 생각하다가 그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통합하고 또 복잡성에 부딪히면 다시 분리를 시작한다. 그런 분석과 통합의 사이의 연결고리는 상상력이 찾아낸다. 그것이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는 즉 지피(知彼)하는 방법이며 그 과정에서 세상을 보는 자신만의 관점이나 시각을 가지게 된다.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와 세계관은 그렇게 얻어진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