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 <알렉산더>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 중 하나로 손꼽히는 가우가멜라(Gaugamela) 전투를 재현해 낸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제국과의 첫 번째 전투인 이수스에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한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다리우스를 즉각 추격하지 않고 페니키아의 적 함대 기지를 공략하고 시리아와 이집트를 손에 넣은 후, BC331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우가멜라 부근의 평원에 진을 치고 있는 적과 결전을 준비한다.

마케도니아 군은 보병 40,000명과 기병 7,000명으로 4만 7천명인데 반해 페르시아 군은 보병 150,000명에 기병 40,000명으로 19만에 달하는 대 병력이었다. 숫자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알다시피 승리자는 알렉산더다. 산악이 많은 그리스에서는 보병 전술이 발달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보병은 긴 창을 앞으로 내밀고 밀집해서 직사각형 전투대형(陳)을 유지하며 전진한다. 방진이라고 부르는 진법이다. 울타리처럼 둘러친 방패로 자신을 보호하며 그 사이로 고슴도치 가시처럼 빽빽한 나온 창 끝이 적을 노린다.
하지만 이런 진형은 기동력이 떨어지고 전진은 가능하지만 방향전환이 쉽지 않다. 기동력 있는 공격도 어렵지만 적의 측면 공격에 허점을 드러낸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는 이 진법에 페르시아와 같은 서아시아의 기병의 전술을 결합시켜 새로운 진형을 완성시켰다.
마케도니아의 기병은 컴패니언 기병으로 불리며 왕실군에 편재되었다. 이 부대는 밀집 대형 보병부대가 적을 저지하고 있는 동안 적의 측면이나 적진의 균열을 노린다. 영화의 장면처럼 알렉산더는 자신의 정예 기병부대와 함께 진의 중앙 뒤에서 적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 마침내 페르시아 군의 정면에 균열이 생기자 알렉산더는 자신이 신뢰하는 기병부대를 이끌고 적진의 중앙을 폭풍이 몰아치듯 돌파해 다리우스 대왕의 군사를 일거에 패퇴시키고 만다. 전쟁의 승패는 가끔 전체 군사력보다 정예부대의 전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전선이 길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렇다. 나폴레옹에게는 제국 근위대(Imperial Guard)라는 정예부대가 있었다. 나폴레옹은 이 부대를 이끌고 적의 심장부나 약한 부분을 기습하는 전략으로 많은 승리를 만들어 냈다.

강한 정예부대가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어쩌면 정예부대는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한 국가의 정예부대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의 자산에 비유될 수 있다. 경쟁우위란 기업의 전체가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가진 경쟁력을 가리킨다. 경쟁우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경쟁우위는 경쟁자와 비교하여 우월한 성과를 갖도록 기업이 개발한 독특한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생태적 지위에서 지위를 위치라고 해석했던 점을 기억해 보자.
위 경쟁우위에 대한 정의에는 최소 두 개의 핵심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하나의 기업이 경쟁우위에 있기 위해서는 경쟁자와 구분될 수 있는 자신만의 독특한 강점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 ‘차별화된 가치’다. 경쟁우위가 가지는 두 번째 개념은 그 자리가 전략적으로 개발한 강점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전략적이란 시장이 요구하는 강점을 알아채고 만들어 낸 경쟁력을 의미한다.
어떤 기업이던 이런 경쟁우위가 하나라도 있다면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말 그럴까? 수 많은 국가간 전쟁과 기업간 경쟁을 살펴보면 강한 자가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진정한 승부를 가르는 차이는 전략이다. 전략이란 단순하게 정의하면 경쟁의 기술이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가 낳은 위대한 병법서 <손자병법>을 영어로 The Art of War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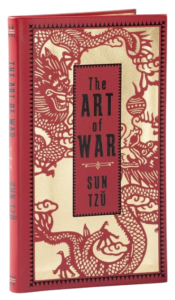

손자병법에 나오는 수 많은 전략 전술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문구는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이다. 우리가 흔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이긴다”고 알고 있는 말의 원문이다.
동양에 손자가 있다면 서양에는 마키아벨리가 있다. 그의 저서 <전술론>의 영어 제목도 ‘The Art of War’이다. 책 제목과도 같이 마키아벨리 역시 자신보다 더 강한 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손자의 생각과 같이 한다. 마키아벨리는 특히 적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려면 속임수와 첩자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피지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나는 나의 적을 알고 나의 적은 나를 모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지피지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경쟁의 기술이 가지는 핵심은 속임수에 있을지도 모른다.


답글 남기기